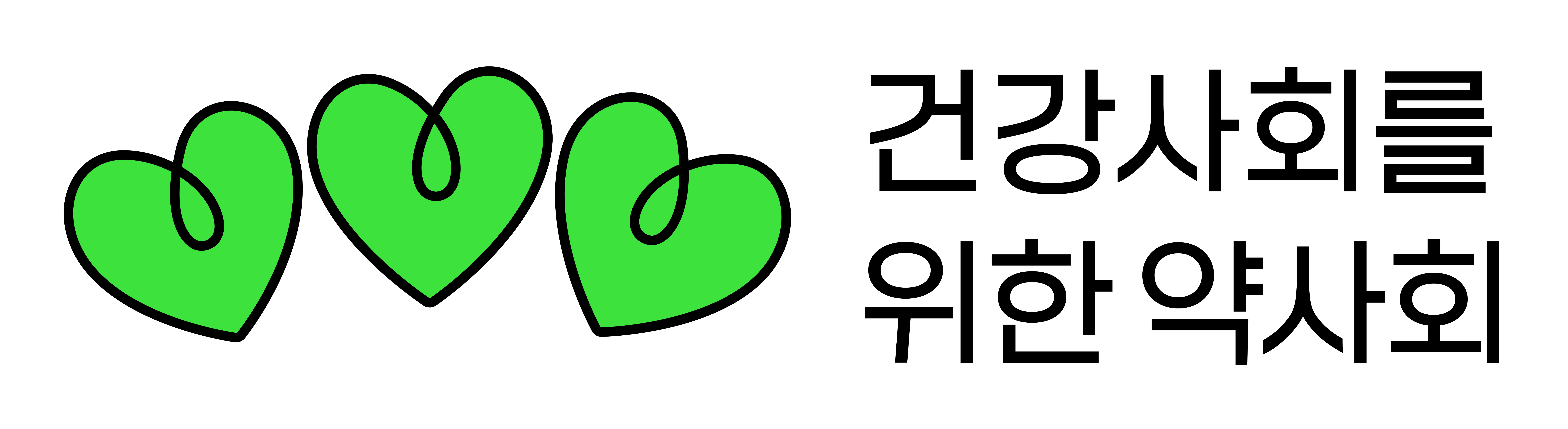- '지옥의 고통' 견뎌야 했던 '알보칠'의 불편한 진실
어린 시절, 입안에 혓바늘이 돋아 밥 먹기 불편하다고 투정을 부리면 부모님은 어김없이 작은 갈색 약병을 들고 오셨다. 면봉에 적신 그 검붉은 액체가 환부에 닿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강렬한 통증이 찾아왔다. 성인이 된 지금도 구내염이 생기면 문득 그 '지옥의 맛'이 떠오른다.
바르는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그 통증 뒤에는 금세 나을 것이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다. 1990~200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전설의 명약' 알보칠(성분명 폴리크레줄렌) 이야기다. 이 약물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강산성 물질, '국민 구내염 약'이 되다
알보칠의 주성분인 폴리크레줄렌(policresulen)은 pH 0.6의 강산성 물질이다. 우리가 흔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염산이나 황산에 버금가는 산도다. 이 강산성 물질을 36%로 희석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약을 바르며 느꼈던 그 극심한 통증은 산성 물질이 생살을 태우는 '화학적 화상'에 의한 고통이었다.
이 약은 환부와 주변 혈관 내 단백질을 응고시켜 일종의 딱지를 만든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을 차단하고 조직을 탈락시키는 원리다. 약에 의해 염증 부위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지만, 우리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이유는 통증을 느껴야 할 조직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폴리크레줄렌은 1950년대부터 사용된 매우 오래된 약물로, 태생은 구내염 치료제가 아니었다. 강력한 항균과 지혈 효과 덕분에 초기에는 질염이나 자궁경부염 등 산부인과 질환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지금도 유럽에서는 주로 그 용도로 사용된다.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도 폴리크레줄렌을 구내염 약으로 사용하지만, 주로 의료기관에서 처치용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이 약물의 구강 내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NADF)은 폴리크레줄렌 성분의 구내염 사용을 금지하고 해당 제품의 회수 조치를 내렸다. 현지 치과의사들이 오랜 기간 약물의 위험성을 경고한 결과였다.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들은 폴리크레줄렌이 구강점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물이 구내염 주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정상 조직까지 괴사시킨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괴사된 조직이 탈락한 뒤, 정상적인 재생이 이뤄지지 않아 구내염이 오히려 더 커지거나 깊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제 치과 및 의학연구저널' 및 국내 여러 학회지에서도 이 약물로 인한 구강점막 화상, 입술 부종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빨리빨리' 문화가 만든 명약 신화
한국에 알보칠이 구내염 약으로 출시된 게 1993년이었는데 빠르게 가정에 국민 상비약으로 자리 잡았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구내염은 대체로 1~2주 이내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질환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빨리 낫기보다는 통증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다. 서구권에서 국소마취제나 소염진통제 성분의 가글을 사용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은 질병 치료에 속도를 매우 중요시하는 문화가 있다. 구내염은 식사를 하거나 말을 할 때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폴리크레줄렌은 바르는 즉시 화학적 화상을 통해 감각을 무디게 하고 병변을 탈락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이다.
'엄청나게 아프지만 빨리 낫는다'는 직관적인 효과가 빨리빨리를 외치는 한국 사람들에게 딱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고강도 노동,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빈번하게 생기는 구내염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그리고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솔루션이기도 했다.
폴리크레줄렌은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대부분 원액을 면봉에 찍어 그대로 환부에 바른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바르면, 환부 이외에 넓게 바르거나 치아까지 닿는 경우도 있다. 모두 위험한 행위다.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한 사회로
구내염은 휴식과 영양 섭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낫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 낫는 시간을 견딜 여유가 없다. 구내염으로 입안이 헐었을 때 살이 타들어 가는 고통을 참으며 강산성 물질을 바르며 바라는 것은 당장의 불편을 낫기 위한 '속도'다. 밥을 빨리 먹고,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한다. '지져서 없앤다'는 폭력적 방법으로 몸의 신호는 틀어 막아버린다.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신체의 안전조차 기꺼이 유예하는 우리 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일 것이다.
이러한 '알보칠의 논리'를 사회시스템으로 확장한 것이 '새벽배송' 아닐까 싶다. 새벽 배송을 위해 밤잠을 줄이며 고강도 야간 노동을 하는 물류 노동자가 있다. 아침 일찍 문 앞에 놓여 있는 물건들은 노동자의 고통을 담보로 한 '속도'다. 알보칠이 내 입안의 점막을 태워 당장의 편안함을 줬다면, 새벽배송은 노동자의 건강을 태워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속도에 집착해 위험을 감수해 왔다. 그런데 내 입안의 점막을 태워 가면서, 또 누군가의 밤잠을 빼앗아 가면서 우리가 그토록 빨리 도달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 사회가 이제 '알보칠'과 헤어질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벽 배송'과 헤어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오랜 기간 중요하게 생각했던 '속도'가 무언가를 담보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말이다. 나는 약국에서 알보칠을 찾는 손님을 만나며, 문득 새벽배송을 떠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