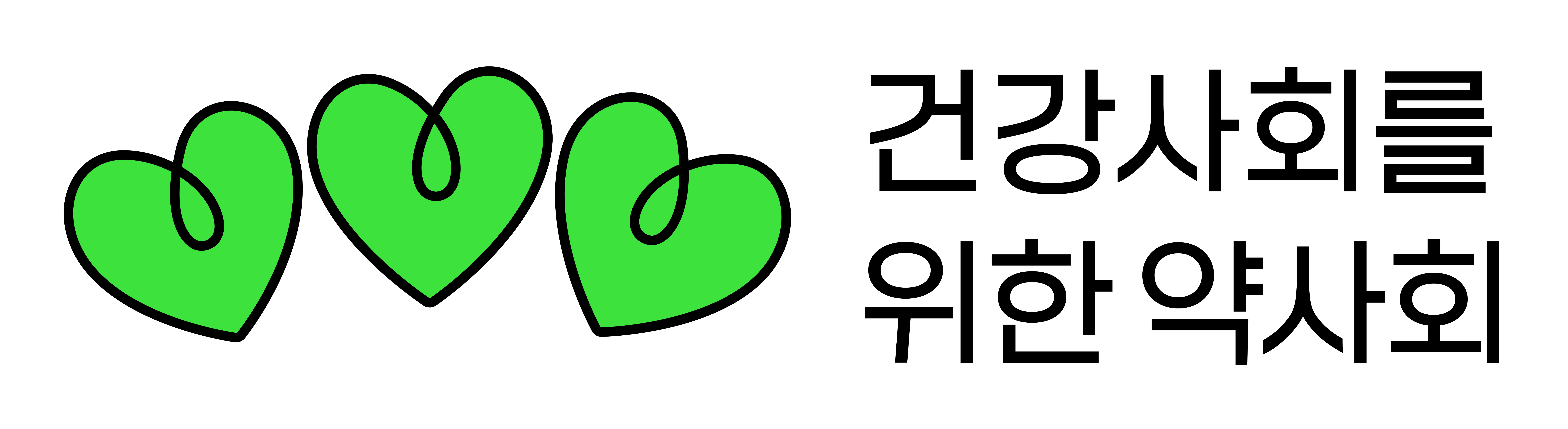- 기업과 정부 부담을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라!
- 대형병원 퍼주기 중단하고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하라!
오늘(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여부를 논의한다.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25일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건강보험 가입자의 77.6%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느끼고, 80.2%가 내년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먹는 게 두려울 정도의 고물가 상황에서도 임금상승은 형편 없어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계 위기가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서민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체납 빈곤층을 늘려 가장 어려운 이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조처다. 설사 보험료율을 동결해도 임금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만으로도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경총이 노동자 서민의 고통을 앞세우는 것은 속 보이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보험료율 결정 직전마다 이런 '대국민 조사'를 발표하는 까닭은 기업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료 부담을 기업과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민들과 달리 대기업들은 보험료 부담 여력이 충분하다. 막대한 부가 축적돼 있을 뿐 아니라 올해 6월엔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이윤도 크게 남았다. 작년 이재용 부회장은 개인 배당금으로만 3465억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낙수효과' 신화와 달리 서민의 삶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기업의 건보료 부담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 많은 나라들이 노동자보다 기업이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한국처럼 반반씩 내는 나라는 드물다. 사회보장기여금 전체로 따지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OECD 국가들은 기업이 평균 4.8%, 노동자가 3.4% 부담했는데, 한국은 기업이 3.7%, 노동자가 3.6% 부담했다. 노동자 부담은 OECD 평균보다 이미 높은 반면 기업 부담은 낮은 것이다. 노동자에 비해 기업이 OECD 평균에 비해 GDP의 약 1.3%를 덜 부담한다. 올해 한국 GDP로 환산하면 34조원쯤 기업이 더 내야 그나마 OECD 평균 수준이 된다.
건강보험 재정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높여 마련해야 한다. 5:5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6:4나 7:3으로 분담 비율을 변경해야 한다. 즉 노동자 서민의 보험료 부담은 동결하거나 낮춰야 한다.
또 정부가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 정부는 매년 법으로 정해진 20% 수준의 재정 부담을 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 서민 호주머니만 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법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한국과 비슷한 사회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들 수준(대만 36%, 일본 28%)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은 축소되고, 민영보험시장은 활성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을 작년에 건강보험재원에서 약 4.6조원 지원했다. 4.6조원이면 이재명정부가 공약한 간병비를 모조리 건강보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의료비 보장이 아닌 대형병원 지원에 쓰면서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목표 보장율과 보장성강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형병원 퍼주기 의료개혁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이제 보장성 확대없는 보험료율 부담 가중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첫 해 건보료 대폭 인상으로 서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낭비적 과잉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며 기업과 정부 부담을 확대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2025년 8월 28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